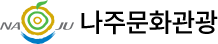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43) 나대용, 1594년 8월에 강진현감에 임명되다
- 작성일
- 2022.11.02 10:04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98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43회 나대용, 1594년 8월에 강진현감에 임명되다.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1594년 1월에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본영(여수)으로 가서 모친 변씨 부인을 뵈었다. 1594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자.
1월 1일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으니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1월 11일
흐렸으나 비는 내리지 않음. 아침에 어머님을 뵈려고 배를 타고 바람을 따라 바로 고음천(여수시 웅천동, 사투리로‘곰챙이’라고 부름)에 도착하였다. 남의길, 윤사행, 조카 분(芬 나중에 이순신 행록을 씀)도 같이 갔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큰 소리로 부르니 놀라 깨셨는데 기운이 가물가물해 살아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시듯 했다. 하릴없이 눈물만 흘러내렸다. 그러나 말씀 하시는 것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셨다. 왜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1월 12일
아침 식사 후 어머니께 하직을 고했다.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속히 씻어야 한다”라고 두세 번 타이르시고, 헤어짐에 조금도 슬퍼하지 않으셨다.
1월 19일
흐리다가 늦게 갰다. 아침에 출발하여 당포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한산도에 도착하였다. (...) 저녁엔 원수사(원균)도 왔다. 소비포 만호(이영남)로부터 경상도 여러 배들의 사부와 격군들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들었다.
1월 21일
저녁에 녹도만호가 와서 병으로 죽은 시체 214구를 모아서 묻었다고
보고하였다.
1월 22일
녹도만호가 병으로 죽은 시체 217구를 모아서 묻었다고 한다.
2월 1일에 겸사복 이상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왔다.
“경상감사 한효순이 장계하기를 ‘좌도의 적들이 합하여 거제로 몰려들어 장차 전라도 지경을 점령할 것이다’하였으니 그대는 삼도수군을 합하여 적을 무찌르라”는 유서였다.
그런데 2월 5일에는 도원수 권율의 회답이 왔는데 명나라 심유경이 이미 화친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2월 13일
오후 6시경에 출발하여 한산도로 돌아오고 있을 때 경상우수사의 군관 제홍록이 삼봉(고성군 삼산면 삼봉리)으로부터 와서 “ 적선 8척이 춘원포에 들어와 정박했으니 들어가 칠만 하다고”말했다. 그래서 곧 나대용을 원수사 (원균)에게 보내어,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들어가 치다가는 큰 이익을 이룰 수 없으므로 우선 내버려두었다가 기회를 보아서 무찔러야 한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나대용이 원균에게 이순신의 분부를 전달하자 원균은 입을 다물고 대답이 없었다. 1)
2월 14일
경상도 남해, 하동 사천 고성 등지는 송희립·변존서·유황·노윤발 등을, 전라우도는 변유헌·나대용 등을 보내 부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나대용은 전라우도 본영인 해남으로 출장을 갔다. 그는 전라좌수영 감조전선출납군병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 전선 건조를 감독하고, 군병의 출납을 담당하는 군관)으로 근무한 바 있었다.
한편 3월 4일과 5일에 조선 연합함대는 주둔지역을 벗어나 진해 등지를 왕래하며 약탈하는 왜선 21척을 당항포에서 격침시켰다. 2차 당항포 해전이었다. 2)
한편 당항포 2차 해전이 끝난 3월 6일에 이순신은 명나라 선유도사 담종인에게서 전투 금지 명령서를 받았다. 당시 명나라와 일본은 강화 협상중이었다.
3월 7일에 이순신은 몸이 극도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서 답서를 군관 정사립에게 구두로 불러 주며 쓰게 한 뒤에 명나라 선유도사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순신은 ‘지금 화의를 맺고자 하는 것은 속임수와 거짓말이라면서 우리 임금에게 급히 아뢰겠다’고 답장했다. 3월 10일에 이순신은 선조에게 명나라의 전투 금지 명령 사실과 왜군 동향을 보고했다.
# 기아와 전염병 극심
4월에 백성들은 굶주림이 심했다. 백성들이 굶주린 나머지 서로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선조는 자신을 죄책하는 교서를 내렸다.
(선조수정실록 1594년 4월 1일)
조경남은 ‘난중잡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o 4월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깔렸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다투어 그 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의 뼈를 발라서 즙을 내어 삼켰는데 사람의 고기를 먹은 자는 발길을 돌리기 전에 모두 죽었다. 슬프도다! 처음에는 왜적의 분탕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탐관오리가 긁어 먹고 겸하여 흉년이 들고 부역은 중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o 내가 마침 성중(城中)에 이르렀을 때에 명나라 병사 한 사람이 취하고 배가 불러 지나가다가 길 가운데서 구토를 하자, 굶주린 백성 천백 명이 일시에 달려가서 머리를 모아 주워 먹는데 약한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물러서서 눈물만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독부(督府) 유정(劉綎)이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쌓인 것을 보고 참혹히 여겨 진소(賑所)를 동문 밖에 설치하니, 굶주린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천백 명의 무리가 거기에 힘입어 조금 연명하다가 그 뒤에 모두 그 옆에서 죽었다.”
그런데 조선 수군은 전염병이 더 심각했다. 4월 20일에 올린 장계이다.
“금년 1월부터 진중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월부터 4월까지 3도 수군의 사망자는 1,304명이고 앓고 있는 사람이 3,759명입니다.”
그랬다. 방답첨사 어영담(1532~1594)도 4월 20일에 전염병으로 죽었다.
어영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양현감으로서 수로향도(水路嚮導)로 큰 공을 세워 절충장군이 되었고, 1594년 3월에는 조방장(助防將)으로 2차 당항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 나대용, 강진현감에 제수되다.
8월 5일에 주부(종6품) 나대용은 강진현감(行康津縣監 종6품)에 제수되었다. 그리하여 1596년 10월 11일에 파직 당할 때까지 2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 3)
강진현은 관할이 지금의 강진군과 완도군이었고, 병마절도사영도 있었다. 바닷가의 진영은 가리포진(加里浦鎭), 고금도진(古今島鎭), 마도진, 신지도진(新智島鎭)이 있었다.
# 어정쩡한 장문포 해전
2차 당항포 해전 이후 별다른 전투가 없었다. 강화협상기간이었다. 그런데 선조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8월 21일에 선조는 영의정 유성룡과 대화하면서 ‘이순신이 일을 게으르게 하는 건 아니냐’는 말을 한다.
9월 3일에 선조의 밀지가 도착했다. 이 날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자.
9월 3일
비가 조금 내렸다. 새벽에 밀지가 들어왔는데 ‘수륙 여러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라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고 했다. 3년 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맹세하여 목숨을 걸고 원수 갚을 뜻으로 날을 보내고 있지만, 험한 소굴에 웅크리고 있는 적을 경솔히 나가 공격할 수 없을 뿐이다. (...) 종일 큰바람이 불었다. 초저녁에 불 밝히고 혼자 앉아 스스로 생각하니 국사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
이런 가운데 조정에선 장문포(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수륙작전이 추진되었다. 9월 19일에 삼도체찰사 겸 좌의정 윤두수는 조선군 단독으로 거제도를 공략하겠다고 선조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9월 27일에 도원수 권율과 의병장 곽재우, 김덕령 등의 육군이 연합함대에 합류했고, 9월 29일에는 장문포의 왜군 진지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왜군은 진지만 지키고 조금도 항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10월 1일에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는 장문포를 공격하기로 하고, 이순신은 충청수사 이순신(李純信)과 함께 영등포를 공격했다. 그러나 왜군은 전혀 응전하지 않아 해질 무렵에 장문포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도 2호선이 육지에 배를 대려 할 때, 왜적의 작은 배가 곧장 달려와서 불을 던졌다. 다행히 불은 꺼졌으나 사도군관은 처벌을 받았다.
10월 3일에도 이순신은 장문포에서 싸움을 걸었지만 적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10월 4일에 이순신은 곽재우ㆍ김덕령 등과 함께 수륙합동공격을 하였다. 곽재우ㆍ김덕령이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고, 수군은 선봉대를 장문포로 보내 들락날락하며 싸움을 걸었지만 왜군은 방어전만 펼쳤다. 저녁에도 수군이 나서서 왜군을 위협했으나, 왜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이순신은 10월 8일에 한산도로 귀환하였다.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된 장문포 상륙전투는 비록 패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라고 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은 2척의 적선을 격침시켰지만, 조선 수군도 야간에 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사후선 3척이 실종되고, 사도 2호선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나중에 윤두수는 책임을 지고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주1) 이 사실은 사단법인 체암 나대용 장군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의 p 57 (충무전서), 85(행적 1872년), 123 (체암 나공 묘비명 병서 1920년)에 실려있다.
그런데 나대용 장군 약사(위 책 p 304)와 나대용 장군 동상 뒷면의 약사에는 “2월 9일 춘원포에 침입한 적선공략에 충무공과 원균 수사의 이견을 조정하여 합동작전에 성공함”이라고 적혀 있어 난중일기와 다르다.
주2) 나대용의 2차 당항포 해전 참전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아마 전라우도로 출장을 가서 출전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주3) 현감은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종6품)과 동격인 지방수령이었다. 조선 시대의 현감은 138명에 이르렀다.
한편 나대용은 1597년부터 1598년 8월까지 금구현령(종5품)을 하였으며, 1598년 9월부터 1599년 3월까지 능성현령을 하였다.
( 참고문헌 )
o 김세곤,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2, 온새미로, 2013
o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 제2권, 비봉출판사, 2006
o 박종평, 이순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꿈결, 2017
o 배상열, 난중일기 외전, 비봉출판사, 2007
o 사단법인 체암 나대용 장군 기념사업회,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 세창문화사, 2015
o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o 이순신 지음, 노승석 옮김, 교감 완역 난중일기, 민음사, 2010
o 이순신 지음, 송찬섭 엮어 옮김,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o 이순신 지음·조성도 역, 임진장초, 연경문화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