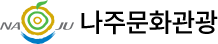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29) 이순신의 장계
- 작성일
- 2022.10.08 17:35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17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29회 이순신의 장계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1592년 7월15일에 전라좌수영(여수)에서 이순신은 ‘한산과 안골포 승전을 아뢰는 장계(견내량파왜병장)’를 조정에 올렸다. 1)
이순신은 ‘삼가 왜적을 잡아 죽인 일을 아뢰나이다.’로 시작하여 한산대첩 그리고 안골포 승전 상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나서 본영으로 돌아왔다고 장계에 적었다.
이어서 이순신은 여러 장수들이 벤 왜적의 수급에 대하여 아뢰었다.
“신의 여러 장수들이 벤 왜적 머리 90급은 왼쪽 귀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 궤 속에 넣어 올려 보냅니다. 신이 당초에 여러 장수와 군사들에게 약속할 때 ‘공훈을 바라는 생각으로 머리 베는 것을 경쟁하다가는 도리어 해를 입어 사상하는 수가 많으니 머리를 베지 않아도 힘껏 싸운자를 제1의 공로자로 정한다’고 두세 번 강조했기 때문에 목을 벤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로를 세운 경상도의 여러 장수들은 작은 배를 타고 뒤에서 관망하던 자로 적선을 30여 척이나 쳐서 깨뜨리자 운집하여 머리를 베었습니다. 2)
대체로 보아 신의 장수들이 목을 벤 것과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억기 등이 거느린 장수가 목을 벤 것을 합하면 거의 250여급이나 됩니다. 그간 바다 가운데 익사하고 혹은 머리를 베고도 물에 빠뜨려 잃어버린 것도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이순신은 왜적의 물건 중에서 의복이나 쌀이나 포목 등은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마음을 위로하고, 군용물품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을 뽑아내어 장계 뒤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왜적의 물품은 길이 끊어져서 조정에 올려 보내지 못하여 모두 본영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이어서 이순신은 잘 싸운 전라좌수영 휘하 장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장계에 적었다.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중부장 광양현감 어영담, 전부장 방답첨사 이순신(李純信), 우부장 흥양현감 배흥립, 우부장 사도첨사 김완, 좌척후장 녹도 만호 정운, 좌별도장 전 만호 윤사공 ·고안책, 우척후장 여도권관 김인영,
좌돌격귀선장 급제 이기남·보인 어언량, 좌부장 낙안군수 신호, 유군장
발포만호 황정록, 한후장 본영군관 전 봉사 김대복·급제 배응록 등은 접전할 때 마다 몸을 잊고 먼저 돌진하여 승첩을 거두었으니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또한 접전할 때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자 명단을 함선별로 일일이 적었다. 사상자는 135명(전사 19명, 부상 116명)이었는데 모두 철환에 맞았다.
전사자 19명은 본영 2호선 진무 순천 수군 김봉수, 방답 1호선의 별군 광양 김두산, 여도선의 격군이며 흥양수군 강필인·임필근·장천봉 (3명),
사도 1호선의 갑사 배중지, 녹도 1호선의 흥양신선 박응구·강진수군 강막동(2명), 녹도 2호선의 격군 장흥수군 최응손, 낙안선의 사부 사사집 종 필동, 흥양 2호선의 격군인 사삿집종 상좌, 사노(寺奴) 귀세 ·사노 말연, 사삿집 종 맹수(4명), 본영 거북선의 토병 사삿집종 김말손·정춘 (2명), 본영 전령선의 순천 수군 박무연, 발포 1호선의 장흥 수군 이갓동·흥양수군 김헌 (2명)이었다.
부상자 116명(판옥선 17척 100명, 거북선 2척 16명 부상)은 이순신 지휘선 5명, 방답 1호선 6명, 방답 2호선 4명, 방답 거북선 6명, 여도선 12명, 본영 1호선 3명, 사도 1호선 11명, 사도 2호선 3명, 녹도 2호선 8명, 낙안 1호선 4명, 낙안 2호선 7명, 흥양 1호선 4명, 흥양 2호선 11명, 광양선 3명, 본영 거북선 10명, 본영 3호선 9명, 발포 1호선 3명, 발포 2호선 3명, 흥양 3호선 4명이었다. 3)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거북선의 사상자가 판옥선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다. 거북선 사상자는 본영 거북선에서 12명(전사 2명 부상 10명), 방답거북선에서 부상자 6명 모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거북선 1척당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판옥선 24척은 사상자가 117명(전사 17명 부상 100명)으로 1척당 4.9 명이었다. 거북선이 왜군의 진형을 무너뜨리고 지휘부를 공격하는 돌격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리에 접근하여, 아무리 거북선 등에 덮개를 덮었다지만 왜군이 쏜 조총을 피하기 어려웠을리라. 4)
그러면 조선과 일본 수군 피해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순신의 연합함대는 한산대첩에서 왜선 59척, 안골포 해전에서 20여 척을 격파했다. 5) 반면에 조선 함선 피해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조선과 일본 수군 사상자는 별도로 서술한다. 6)
한편 이순신은 전투에서 녹도만호 정운, 순천부사 권준, 5령장 최도전, 광양현감 어영담, 웅천현감 허일이 구출한 조선 백성들의 문초 내용을 장계에 자세하게 적었다. 여기에는 왜군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 담겨 있었다. 이들 여러 사람의 문초 내용이 비록 낱낱이 믿을 것은 못 된다 하더라도 3개 부대로 나누어 배를 정비하여 전라도로 향한다는 말은 근거가 있었다.
이들 중 와키자카의 부대는 한산도에서, 구키와 가토의 부대는 안골포에서 격퇴되었기에, 이순신은 세 번째 부대가 전라도를 침범해 올 가능성을 우려하여 진을 파하고 본영으로 돌아왔다.
끝으로 이순신은 여러 장수와 군사 및 관리들이 분연히 제몸을 돌보지 않고 승첩하였지만 조정이 멀리 떨어져 있고 길이 막혀 군사들의 공훈 등급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결정한다면 군사들을 감동케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등으로 별지와 같이 기록하여 조정에 올렸다.
제3차 해전의 공로로 조정은 이순신에게 정헌대부(정2품)를, 원균과 이억기에게는 가선대부(종2품)로 승진시켰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정헌대부를 내리는 교서에서 이렇게 읊었다.
“전함을 불꽃 속에 던져 넣음이여. 당항포에 쌓인 송장에 강물 흐리고, 악독한 적을 파도위에서 크게 무찌름이여, 한산섬 비린내 풍기는 피가 바닷물을 불렸도다.”
주1) 이순신 지음·조성도 역, 임진장초, p 65-77
주2) 경상우수군의 치졸함이 엿보인다.
주3)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면 전라좌수영 5관 5포의 전함 26척(판옥선 24척 거북선 2척)을 짐작할 수 있다.
본영 6척 : 지휘선, 본영 1호선, 본영 2호선, 본영 3호선, 본영 우후선,
본영 거북선
순천 3척 : 순천대장선, 순천1선, 순천 2선
보성 1척 : 보성선
낙안 2척 : 낙안 1호선, 낙안 2호선
광양 1척 : 광양선
흥양 3척 : 흥양1호선 흥양 2호선, 흥양 3호선
방답 3척 : 방답 1호선, 방답 2호선, 방답 거북선
사도 2척 : 사도1호선, 사도 2호선 , 사도3선
여도 1척 : 여도선
발포 2척 : 발포 1호선, 발포 2호선
녹도 2척 : 녹도 1호선 녹도 2호선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p 288 참조 )
주4)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의 거북선의 위용과는 달리 한산대첩에서 거북선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이순신의 장계에는 거북선의 활약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이 없다.
주5) 이민웅 (p 172)은 한산해전에서 일본 함대는 59척이 분멸 격침되었다고 적었다. 그런데 황현필(p 152)에서 전함 47척 침몰, 12척 나포로 적었다.
주6) 조선 수군 사상자는 한산과 안골포 해전을 합하여 전라좌수군만 135명(사망 19명 부상 116)명이다. 이는 이순신의 장계에 근거한다. 그런데 두 해전에서 전라우수군과 경상우수군 사상자는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본 수군 사상자는 한산 해전에서는 9천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민웅, p 174) 이는 1592년 7월 1일의 ‘선조수정실록’의 “왜진(倭陳)에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조선의 한산도 전투에서 죽은 왜병이 9천 명이다.’고 하였다.”는 기록과 이순신의 조카 이분의 이충무공 행록 그리고 승지 최유해의 행장(박기봉, 충무공 이순신 전서 4권, p 331, 373)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대제학 이식의 시장에는 1만명이라고 적었고(박기봉, 충무공 이순신 전서 4권, p 394)으로 신호영(p 127)은 한산해전 전사자를 3천∽4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김태훈 (p 215-216)은 5,9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배상열(p 359)은 최소한 5천명으로 보았다.
반면에 안골포 해전에 대한 일본 수군 사상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이순신도 안골포해전의 일본 수군 사상자에 대해 ‘부지기수(不知其數)’라고 장계에 적었다.
그런데 황현필은 저서‘이순신의 바다’에서 한산대첩에서 조선군은 3명 사망, 10여명 부상당하고 왜군은 9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안골포 해전에서 조선군이 13명 전사, 104명이 부상당하고 왜군은 3,960명의 사상자가 생겼다고 적었다. (황현필, p 152, 161)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구나 황현필의 책에는 한산과 안골포 해전을 합한 조선군 사망자가 16명이다. 이는 이순신이 장계에 보고한 전라좌수군 사망자 19명보다 3명이나 적다. 또한 한산해전에서 사상자가 13여 명이고 안골포 해전에서는 사상자가 117명이나 되어 안골포 해전의 사상자가 한산해전보다 10배 이상 많은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반드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 참고문헌 )
o 기타지마 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o 김종대,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가디언, 2012
o 김태훈 지음, 그러나 이순신이 있었다, 일상이상, 2014
o 박기봉 편역, 충무공 이순신 전서 1권·4권, 비봉출판사, 2006
o 배상열, 난중일기 외전, 비봉출판사, 2007
o 신호영, 이순신의 전쟁, 돋을새김, 2012
o 이순신 지음·조성도 역, 임진장초, 연경문화사, 1997
o 이민웅, 이순신 평전, 성안당, 2012
o 이봉수, 이순신이 지킨 바다, 가디언, 2021
o 조성도, 충무공 이순신, 연경문화사, 2004
o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o 황현필, 이순신의 바다. 역바연,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