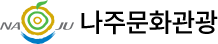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16)선조, 서도(西道)로 파천하다.
- 작성일
- 2022.08.24 09:33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6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16회 선조, 서도(西道)로 파천하다.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4월 28일
조정에서는 도성을 지키고자 우의정 이양원을 수성대장(守成大將)으로, 이전ㆍ변언수를 경성좌우위장(京城左右衛將)으로, 상산군 박충간을 경성 순검사(京城巡檢使)로 삼아 경성(京城)을 지키게 했다.
그런데 이일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인심이 흉흉하였다. 궁중에서는 이미 파천(播遷)할 뜻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마(理馬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직책) 김응수가 빈청(賓廳 대신들 대기장소)에 이르러 영의정 이산해와 귓속말을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이때 이산해가 사복 제조(司僕提調 기마와 마필에 관한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있다가 도승지 이항복이 손바닥에 ‘입마영강문외(立馬永康門外
말을 영강문 밖에 세웠다)’라는 여섯 글자를 써서 유성룡에게 보였다.
이에 대간(臺諫)이 이산해의 나라 그릇친 죄를 탄핵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이윽고 기성부원군 유홍이 상소하였다.
“경성을 굳게 지켜 사직과 같이 죽기를 청하옵니다. 도망치려고 준비한 짚신은 궁중에서 사용할 물품이 아니고, 백금(白金)은 적을 쳐부술 물건이 아닌데도 짚신과 백금을 사들이라 명하시니 전하께서 어찌하여 망국(亡國)할 일을 하십니까?”
이러자 선조는 유홍을 불러 위안하며 타일렀다.
또한 종친 수십 명이 합문(閤門) 밖에 모여서 통곡하며 경성을 버리지 말기를 청하니 선조는 종묘사직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장차 어디로 가리오.’
하며 타일렀다.
사람들이 드디어 물러 나왔으나 사태는 심각했다.
선조는 대신과 대간을 불러들여 파천(播遷)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다. 대신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파천의 부당함을 극언하였다.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아뢰었다.
"종묘와 원릉(園陵)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의 원군(援軍)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승지 신잡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엔 80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수찬 박동현도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연(輦)을 멘 인부도 길 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신하 모두가 목놓아 통곡하니 선조는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대신 이하 모두가 입시할 적마다 파천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오직 영의정 이산해만은 우승지 신잡에게 옛날에도 피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자 모두가 웅성거렸고 사헌부과 사간원이 합계하여 이산해의 파면을 청했으나 선조는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도성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고수하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되었다.
병조(兵曹)에서는 마을 주민 및 공천(公賤)ㆍ사천(私賤)ㆍ서리(胥吏)ㆍ삼의사(三醫司)를 징발하여 나누어 성을 지키게 하였다. 처음에 3만 명을 계획했으나 모인 사람은 겨우 7천 명이었다. 이들도 모두 오합지졸로 성을 넘어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신들이 세자를 세워서 인심을 안정시키기를 청하니 임금이 좇아서 광해군(光海君)을 세자를 삼았다. (선조실록 1592년 4월 28일 4번째 기사)
# 4월 29일
29일 저녁에 전립(氈笠)을 쓴 세 사람이 숭인문(崇仁門)으로 달려 들어왔다.
성내 사람들이 다투어 가며 군중(軍中)의 소식을 물었다.
“나는 순변사 신립 군관과 부하들이요. 어제 순변사는 충주에서 패하여 죽고 모든 군사는 무너져 흩어졌소. 우리들은 간신히 탈출하여 집안 식구들이나 피난 시키려고 오는 길이요.”
이들 듣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자연스레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해졌다. 얼마 안되어 성안을 떠들썩하고 혼란에 빠졌다.
조정에서는 신하들을 불러 피신할 의논을 했다. 임금은 동편 월랑에 의자 없이 앉아 있었다. 등촉을 밝혀 놓고 하원군 이정ㆍ하릉군 이린이 모시고 급히 재상들을 불러 파천을 의논하였다.
영의정 이산해 : “사세가 이쯤 되었으니 행차가 평양으로 가시는 것이 가합니다.”
도승지 이항복 :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여 회복을 도모할 뿐입니다.”
장령 권협 : “경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며 강경히 청하였다.
좌의정 유성룡은 : “권협의 말이 충성스러우나 지금 형세가 그러하니 파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선조는 서도(西道 황해도·평안도)로 파천을 결정했다. 세자는 임금의 행차를 따르고 여러 왕자는 각 도에 보내 근왕병(勤王兵)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임해군은 함경도로 가는데, 김귀영ㆍ 윤탁연이가 따르게 하고, 순화군은 강원도로 가는데 황정욱ㆍ황혁ㆍ이기가 따르게 하였다.
아울러 선조는 상중(喪中)인 김명원을 기복(起復)하여 도원수로 삼고 신각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에 주둔하게 하고 변언수를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592년 4월 29일 2번째 기사)
그리고 윤두수에게 어가를 호종할 것을 명했다.
이어서 이일의 장계가 도착했다.
“적이 금명간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일이 장계가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 선조는 대궐 밖으로 나갔다. 호위하는 군사들은 모두 달아나고 궁문(宮門)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으며 금루(禁漏)는 시간도 알리지 않았다.
# 4월 30일
30일 새벽, 비가 쏟아지고 밤은 칠흙 같았다. 선조가 창덕궁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인마(人馬) 등이 대궐 뜰을 가득 메웠다. 선조와 세자 광해군은 말을 타고 중전 이하는 뚜껑있는 교자를 탔다.
어가가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을 나와 사현(沙峴 홍제동 무악재)에 이르자,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뒤돌아 성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와 불길이 공중에 솟구쳤다. 난민(亂民)들이 먼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가 있는 장례원(掌隷院)과 형조(刑曹)를 불태우고, 내탕고(왕실 금고)에 들어가 금과 비단을 다투어 가져가고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을 불태워버렸다.
역대의 보물이며 문무루(文武樓)와 홍문관에 소장한 서적, 춘추관(春秋館)에 있던 실록(實錄)과 창고에 있던 사초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또 임해군ㆍ전 병조 판서 홍여순의 집을 불질렀다.
그런데 비는 더욱 세차게 왔다. 숙의(淑儀)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宮人)들은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사현(沙峴)을 넘어 석교(石橋 홍제원 근처에 있던 돌다리)에 이르자 비가 더욱 심해졌다. 일행들이 서쪽으로 향하여 달아나면서 질서가 없었으며 서로 부르짖었다. 경기도 관찰사 권징이 뒤쫓아 와서 어가를 모시면서 비 옷을 바치니 임금이 그것을 입고 갔다.
임금이 벽제관(碧蹄館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이르자 일행들이 모두 비에 젖어서 갈 수가 없었다. 역사(驛舍)에 들어가 쉬면서 점심을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세자는 반찬도 없었다. 병조판서 김응남이 흙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고, 경기도 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혜음령(惠陰嶺 고양시 고양동과 파주시 평탄면 사이 고개)을 지나자 큰 비가 물 퍼붓듯 하였다. 궁녀들은 푸르고 흰 천으로 머리와 낯을 가리고 울부짖으며 따라갔다.
마산역(馬山驛 파주시 교하. 개성으로 가는 역원)을 지나자 어떤 사람이 밭두렁에 있다가 어가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소리쳤다.
“나라에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저녁에 선조 일행은 임진강 나루에 닿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선조는 시신(侍臣)들을 보고 엎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나룻배에서 선조는 영의정과 좌의정 류성룡을 불러 이야기 하였다.
임진강을 건너자 선조는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의 인가(人家)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또한 선조는 나루터 남쪽에 있는 승청(丞廳 나루터를 관리하는 관청)을 불태우도록 명했다. 왜군이 승청을 허물어 나무를 취하여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밤 8시에 동파역(경기도 장단군 일대 역참)에 이르니 파주 목사 허진과 장단 부사 구효연이 간단히 수라상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호위하던 사람들이 종일 굶었던 참이라 마구 부엌으로 들어와 음싣을 훔쳐 먹었다. 임금께 올릴 음식이 모자라게 되자 허진과 구효연은 문책이 두려워 달아나 버렸다.
이런 즈음에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경상도로 나가 적을 물리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o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o 김성한, 7년 전쟁 2권 전쟁의 설계도, 산천재, 2012
o 류성룡 지음·오세진 외2인 역해, 징비록, 홍익출판사, 2015
o 유성룡 저·김문수 엮음, 징비록, 돋을새김, 2009
o 유성룡 지음·이민수 옮김, 징비록, 을유문화사, 2014
o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DB, 연려실기술·재조번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