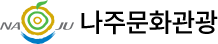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9) 선조,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다.
- 작성일
- 2022.07.26 10:34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26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9회 선조,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다.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선조,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파격 승진시키다.
1591년 2월 13일에 선조는 정읍현감(종6품) 이순신(1545-1598)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정3품)에 임명하였다. 7계급이나 뛰어오른 파격 승진이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심대(沈岱)를 사간에, 이홍을 강원도 도사에, 이경록(李慶祿)을 나주 목사에, 성윤문을 갑산 부사에 제수하였다.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전라감사 이광(李洸)은 자헌대부에 가자하고, 윤두수는 호조 판서에, 이증(李增)은 대사헌에, 진도군수 이순신(李舜臣)은 초자(超資)하여 전라도 좌수사에 제수하라.’”(선조실록 1591년 2월 13일)
1591년 2월 1일의‘선조수정실록’에도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임명 내용이 실려 있다.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사로 삼았다. 이때 이순신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칭찬과 천거가 잇따라서 정읍현감(종 6품)에서 진도 군수(종 5품)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기도 전에 가리포 첨사(종 3품, 완도군 소재)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수사(정3품)로 발탁되었다.”
이처럼 이순신은 정읍현감(종6품)에서 7계급을 뛰어넘어 전라좌수사(정3품)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순신이 정읍현감에 임명된 1589년 12월 1일 ‘선조수정실록’을 읽어보자.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았다. 이순신이 (전라)감사 이광(李洸)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았다. (이순신은 1589년 봄에 전라감사의 군관이 되었다.)
류성룡이 이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賓友)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성적(聲績)이 있었다.”(선조수정실록 1589년 12월 1일)
이를 보면 류성룡이 이순신을 정읍현감으로 천거했음을 알 수 있다.
류성룡은 이순신을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 ‘징비록’에 나온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 영특하고 씩씩하여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여러 아이들과 놀 때 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어 마을에서 놀면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눈에 대고 활을 쏘려 하였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른들도 이를 꺼려 그의 집 문 앞을 지나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유성룡 지음·이민수 옮김, 징비록, 을유문화사, 2014, p 291)
이순신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서울 건천동은 군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원과 인접해 있었다. 류성룡(1542∽1607)은 이순신과 이웃인 묵사동(서울시 중구 묵정동)에서 살았는데 이순신의 둘째 형 이요신(1542∽1580)과 동갑내기 친구였다.
류성룡은 13세(이순신은 10세)에 동학(東學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사학(四學)중의 하나)에 다니면서 『대학』·『중용』을 공부했다. (서애집, 서애선생 연보)
그런데 선조는 1590년 7월에 정읍현감(종6품) 이순신을 평안도 강계에 있는 고사리진 첨사(종3품)로 승진시켰다가 대간들의 반대로 취소하였다. 한 달 후인 8월에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평안도 강계의 만포첨사(정3품 당상관 품계)로 삼았다. 그러나 대간이 또 논핵하자 선조는 임명을 철회했다.
1591년 2월 4일에 원균이 전라좌수사에 내정되었다. 하지만 사간원이 이전에 수령을 할 때 근무성적이 최하위였음을 이유로 원균을 체차하고 젊고 무략(武略)이 있는 사람을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라고 청하자 선조는 원균을 체차하였다. (선조실록 1591년 2월 4일)
이로부터 9일 후인 2월 13일에 선조는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정3품)에 임명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꼭 14개월 전이었다.
이순신이 이처럼 발탁된 것은 류성룡의 천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현충사 관리소에서 일한 김대현은 이순신은 우의정 이산해와 병조판서 정언신의 추천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김대현 지음, 충무공 이순신, 예맥, 2014, p 26)
그런데 이순신이 임명된 3일 후인 2월 16일에 사간원이 이순신의 체차를 청했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招授)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이러자 선조가 답했다.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선조실록 1591년 2월 16일)
2월 18일에도 사간원이 이순신의 체차를 아뢰었다.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으므로 중망(衆望)에 흡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령을 갑자기 수사(水使)에 승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뒤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빨리 체차시키소서.”
다시 선조가 답하였다.
"이순신에 대한 일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면 개정하지 않겠는가. 개정할 수 없다. "(선조실록 1591년 2월 18일)
이 시기는 1591년 1월 28일에 부산에 도착한 조선통신사 정사 황윤길이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조정에 보고하여 나라가 시끄러운 때였다.
# 이순신, 전란에 대비하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 아래에 5관 5포를 관할하고 있었다. 5관은 순천도호부(순천시), 보성군, 낙안군(승주군), 흥양현(고흥군). 광양현(광양시)이고, 5포는 방답진(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사도진(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여도진(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녹도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발포진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이었다. 주1)
그런데 이순신은 1580년 7월부터 1582년 1월까지 발포만호로 근무한 적이 있어 전라좌수영은 그리 생소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전란에 대비했다. 그런데 부임한 지 5개월 되는 1591년 7월에 비변사(備邊司)가 “왜는 수전에 강하지만 육지에 오르면 불리할 것이니 육지의 방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아뢰었다. 선조는 호남·영남에 명하여 성을 증축·수비케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7월 1일)
이러한 수군 홀대 정책으로 이순신은 조정의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다. 오로지 자력으로 전란에 대비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1591년 11월에 홍문관 부제학 김성일이 이순신의 발탁은 잘못됐다고 상소하여 이순신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11월 1일)
더구나 조정에서는 신립(申砬1546-1592)주2)이 수군을 없애고 육전에만 진력하자고 주청하자, 이순신은 곧 장계를 올려 “바다로 오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을 따를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군과 육군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자 조정에서도 그의 의견을 옳겨 여겼다. (이순신의 조카 이분의 ‘이충무공 행록’) 주3)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순신은 군기(軍紀)를 확립하고, 강한 수군을 만들며 전함을 수리하고 화포와 무기를 정비했다. 또한 바다에 쇠사슬을 설치했고, 거북선을 창제했다.
주1) 전라좌수영은 가장 작은 규모였다. 전라우수사 이억기가 다스린 전라우수영은 본영이 해남으로 8관 13포로, 나주목, 영광군, 함평현, 영암군, 해남현, 무안현, 진도군, 장흥도호부등 8관과 가리포, 임치. 목포 법성포 군산포, 회령포, 이진, 어란포등 13포 였다. 한편 경상좌수사 박홍이 지휘한 경상좌수영은 본영이 동래로 관할은 7관 10포였고, 원균이 지휘한 경상우수영은 본영이 거제로 관할은 8관 16포였다.)
주2) 신립은 1583년에 온성부사로 있을 때 여진족 이탕개(尼湯介)의 1만 여 명의 군대를 물리쳐 명성을 얻었다. 1584년 3월에 선조는 그를 함경도 북병사로 임명하였다. 그는 1590년 2월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나갔다가 내직인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신립은 선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신성군(?~1592)의 장인으로 가장 실세였다. 1591년 2월에 서인의 영수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건의하자 선조는 화가 나서 정철을 파직시켜 버렸고 서인은 몰락했다. 선조는 인빈 김씨가 낳은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3) ‘선묘중흥지’와 1592년 4월 14일의 ‘선조수정실록’에도 나와 있다.
해도(海道 경상 ·충청 ·전라)의 수군을 없애고 수군은 육지에 올라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급히 아뢰었다.
“바다로 들어오는 적을 저지하는 데는 수군을 따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군이나 육군이나 그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