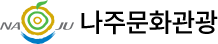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7) 무사안일한 조선 조정
- 작성일
- 2022.07.19 13:08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44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7회 무사안일한 조선 조정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현소, 가도입명(假道入明)을 넌지시 알리다
1591년 1월 말에 황윤길·김성일 등 조선통신사가 귀국할 때 하카다 성복사 승려 현소(玄蘇 1537~1611, 게이테쓰 겐소)와 야나가와 시게노부(平調信) 일행이 회례사로 동행했다. 현소 일행은 부산포에서 선위사(宣慰使) 오억령의 접대를 받았다. 현소는 처음에는 자못 오만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오억령에게 화답을 요구하였다. 오억령이 즉석에서 그 운자에 맞추어 지으니 현소가 탄복하고는 공손해졌다.
오억령은 현소가 ‘내년에 길을 빌어 명나라를 침범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아뢰었다. 그런데 조정은 크게 놀라 오억령을 체직시키고, 응교 심희수로 대신케 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3월 1일 6번째 기사)
그런데 오억령이 한양으로 돌아와서 일본 사신과 문답한 일기를 바치면서 왜군이 반드시 침략할 형세라고 극언하였으나, 조정은 시의(時議)에 크게 거슬린다며 질정관(質正官)으로 보내버렸다.
이윽고 윤 3월에 현소와 시게노부 등이 서울에 도착하여 동평관(東平館)에서 묵었다. 선조는 비변사의 의논에 따라 황윤길·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사적으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면서 왜국의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자 현소가 김성일에게 은밀히 가도입명(假道入明) 요구를 전달했다.
현소는 히데요시의 ‘정명향도’ 요구를 ‘가도입명’으로 슬쩍 바꾸어 흘린 것이다.
현소 :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거절하여 조공을 바치러 가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때문에 분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쌓여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만약 조선에서 먼저 명나라에 주청하여 조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조선은 반드시 무사할 것이고 일본 66주의 백성들도 전쟁을 치르는 노고를 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김성일 등이 대의(大義)로 헤아려 볼 때 옳지 못한 일이라고 타일렀다.
현소가 다시 말했다.
"옛날에 고려가 원(元)나라 병사를 인도하여 일본을 쳤습니다. 이번에 조선에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김성일은 현소의 말이 점점 더 패악하여 다시 캐묻지 못하였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윤 3월 1일)
4월에 선조는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 현소 등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5월에 현소 등이 돌아가자 선조는 답서를 주었다.
1591년 5월 1일의‘선조수정실록’에 실려있다.
“조선 국왕은 일본 관백(關白) 전하에게 회답합니다. 사신들이 와서 귀체(貴體) 건강하심을 알았으니 기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신의(信義)로써 사귀어 큰 물결이 치는 만리 길에도 때때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였고, 이제 또 폐기했던 예를 다시 닦아 옛날의 우호(友好)를 더욱 굳게 하였으니 실로 만대의 복입니다. (...) 그러나 두 차례에 보내신 글에서 중국으로 쳐들어가고자 하는 사연이 장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게 한패가 되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또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요?
귀국(貴國)이 중국을 범하자는 말을 한 데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문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는 것도 교린(交隣)의 도리가 아니므로 감히 이렇게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은(殷)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께서 봉함을 받은 땅으로, 예의의 아름다움으로 중국의 칭송을 받아 온 지 무릇 여러 세대입니다.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됨에 이르러서는 위엄과 은택이 먼 곳까지 미쳐서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모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루어 감히 거역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귀국 또한 일찍이 바다를 건너 조공을 바치러 중국 서울에까지 갔었던 처지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번방(藩邦)의 예의를 대대로 지켜 나라를 지킴에 공경스럽고 제후로서의 법도에 허물이 없으며, 중국도 우리를 대접하기를 자기 땅같이 여겨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환란을 서로 구하는 것이 마치 한 집안의 부자(父子)와 같습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니 귀국도 일찍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당(黨)이란 편파적이고 곧지 못함을 말합니다. 신하가 되어 작당하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하물며 군부(君父)를 버리고 이웃 나라와 어찌 작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미년(1547년)에 접대하고 대우한 것이 격식에 틀렸다는 것은 비록 그 까닭은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시대도 바뀌었으니 영원히 원수로 심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하가 새로 즉위하였으니, 마땅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루만질 계획을 수행하리라고 여겼는데, 어찌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범하기 위해 군사를 움직여 아득한 중국을 치려고 망동하십니까?
아! 어진 자는 다른 나라를 치자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군부(君父)의 나라임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본래 예의를 지켜 군부를 존경할 줄 알고, 큰 윤리와 법도에 힘입어 타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사사로운 교류 때문에 천부(天賦)의 상도(常道)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귀국이 오늘날 분노하는 것은 중국에게 버림을 받은 지 오래여서 예의를 본받을 곳이 없고 무역을 하지 못하며 조공을 바치는 모든 나라의 행렬 속에 끼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데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귀국은 어찌 그렇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여 마땅한 도리를 다하려 하지 않고 오직 불량한 꾀에만 의지하려 합니까? 생각하지 못함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포(二浦 :부산포와 염포)의 개항에 관한 일은 선조 때부터 서약을 정하여 금석같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사신 왕래의 일시적 게으름 때문에 오래도록 지켜 내려온 법을 가벼이 고친다면, 피차에 모두 실수가 되는 것이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변변찮은 토산물은 그 목록을 따로 적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때에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5월 1일 3번째 기사)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는 조선의 답서를 받자마자 단 한 척의 배로 부산 절영도(絶影島)에 닿았다. 그는 경상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요시토시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변장(邊將)에게 말했다.
“일본이 명나라와 통교하려고 한다. 조선에서 이 사실을 중국에 주청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미리 와서 알려주는 것이다.”
변장이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었으나 조정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요시토시는 10여 일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이후로는 해마다 조공 오던 왜선이 다시 오지 않았고, 왜관(倭館)에 머물던 왜인이 항상 수십 명이었는데 점차 일본으로 되돌아가 임진년 봄에 와서는 온 왜관이 텅 비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5월 1일 14번째 기사)
# 조정, 수군은 소홀히 하고 육지 방어에만 힘쓰다.
이때 조정에서는 왜에 관한 일을 매우 걱정하여 변방의 일을 아는 재신(宰臣)을 뽑아 삼도(三道)로 나누어 파견하여 군무(軍務)를 순찰하여 대비하게 했다. 김수를 경상도 순찰사로, 이광을 전라도 순찰사로, 윤선각을 충청도 순찰사로 삼았다.
7월에 조정은 호남·영남의 성읍을 수축하였다.
“호남·영남의 성읍을 수축하였다. 비변사가, 왜적은 수전에 강하지만 육지에 오르면 불리하다고 하여 오로지 육지의 방어에 힘쓰기를 청하니(倭長於水戰, 若登陸, 則便不利, 請專事陸地防守), 호남·영남의 큰 읍성을 증축하고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경상감사 김수는 더욱 힘을 다해 봉행하여 축성를 제일 많이 하였다. 영천·청도·삼가(三嘉)·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좌우병영(左右兵營)에 모두 성곽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성을 크게 하여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험한 곳에 의거하지 않고 평지를 취하여 쌓았는데 높이가 겨우 2∼3장에 불과했으며, 참호도 겨우 모양만 갖추었을 뿐 백성들에게 노고만 끼쳐 원망이 일어나게 하였는데, 식자(識者)들은 결단코 방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선조수정실록 1591년 7월 1일 6번째 기사)
7월 22일에 김성일은 홍문관 부제학으로 영전하였다. 11월에 김성일은 영남에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폐단을 논하였다. 또한 이순신의 발탁은 잘못됐다고 상소했다. (선조수정실록 1591년 11월 1일)
이러자 경상감사 김수는‘성을 쌓는 일에 사대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지되고 있다’고 장계를 올렸지만 갈등만 낳았고, 왜침 대비는 속도와 힘을 잃은 채 흐지부지됐다.
또한 김성일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지 9개월이 지나서 다시 문제 삼았다. 만약 선조가 김성일의 말을 듣고 이순신을 교체했으면 어떠했을까? 조선은 아마 망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