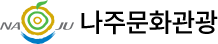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4) 나대용의 나주 낙향과 정해왜변(손죽도 사건)
- 작성일
- 2022.07.08 09:31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17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4회 나대용의 나주 낙향과 정해왜변(손죽도 사건)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나대용, 나주로 낙향하다.
1583년 봄에 별시무과에 합격하여 훈련원 봉사로 근무한 나내용(1556~1616)은 1587년에 훈련원 봉사직을 그만두고 나주로 낙향하였다.
사단법인 체암 나대용 장군 기념사업회가 제공한 ‘나대용 장군 약사(略史)’에 나온다.
·1587-1590 (선조 20년 – 선조 23년)
장차 국난이 있을 것을 예측, (훈련원) 봉사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본격적으로 거북선을 연구, 각고의 노력 끝에 오륜동 앞 ‘방죽골’에서 그 실험 진수에 성공함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체암 나대용 장군, 세창문화사, 2015, p 303)
그런데 1587년 2월에 손죽도 사건이 일어났다. 왜선 18척이 전라도 흥양(興陽 고흥) 관내에 있는 손죽도(損竹島 지금은 여수시 삼산면 소재, 조선 시대에는 '손대도(損大島)'로 불리다가 1914년에 '손죽도'로 개칭)를 침범하였는데, 녹도만호 이대원(李大元 1566~1587)이 막아 싸우다가 패하여 죽었다. 나이 21세였다. 이대원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1583년에 별시 무과 급제했다. 그는 성적이 500인 중 43등(나대용은 65등)을 하여 출세길이 빨랐다. 1586년에 훈련원 선전관을 하다가 1587년에 녹도진(고흥군 도양읍)의 만호(종4품)로 부임했다.
1587년 1월 말경에 일본 규수의 오도(五島)와 평호도(平戶島) 출신들이 탄 왜선 두 척이 손죽도 앞바다에 침범했다. 보통 때 같으면 동남풍이 부는 4월 이후에 왜선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깨고 일찍 침범한 것이다. 녹도만호 이대원은 왜구가 눈앞에 있으므로 전라좌수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출동하여 그들을 쳐서 수급을 베었다. 그런데 전라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이 자기의 공으로 삼은 것을 미워하였다.
며칠 후인 2월 1일에 왜선 18척이 다시 손죽도에 나타났다. 이대원은 심암의 명령에 의해 피로에 지친 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출병했다.
이때 이대원은 “지금 해도 저물었고 또 군사들도 적어 덮어놓고 출전하는 것은 무모할 따름이니,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선단을 크게 지어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출전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라고 심암에게 진언했다.
그러나 심암은 도리어 협박까지 하면서 즉각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대원은 “그러면 사또께서 곧 응원군을 거느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출전했다.
그런데 왜구는 1,500명인데 이대원의 군사는 100명에 불과해 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대원은 조총을 쏘아대는 왜구와 3일간 싸웠으나, 심암은 쳐다만 볼 뿐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왜구들은 조총과 불화살을 날리며 계속 공격해 들어왔고 백병전에 강했다. 조선 배에 올라 칼을 휘두를 때마다 녹도진의 수졸들은 낙엽처럼 쓰러졌다. 마침내 이대원은 모든 군사를 잃어버리고 전함조차 깨지고 말았다. 이대원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칼을 들어 손가락을 자른 피로 속저고리에 절명시(絶命詩) 한 수를 썼다. 그리고 곁에 남아있던 집안 노비에게 주며 “이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라. 너도 얼른 배에서 내려 손죽도 올라가 숨어라”고 말했다.
이대원의 절명시이다.
해 저무는 진중에 왜구들 바다를 건너 쳐들어 오니 日暮轅門渡海來
병사는 적어 외롭고 힘이 다했으니 장수는 서글프네 兵孤勢乏此生哀
임금과 어버이께 은혜도 의리도 모두 갚지 못하니 君親恩義俱無報
한스런 사람의 시름에 구름도 흩어질 줄 모르는구나 恨人愁雲結不開
결국 이대원은 왜구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왜구들은 이대원에게 항복하라고 위협했으나 굴복하지 않자 배의 돛대에 이대원을 묶어 놓고 사정없이 때렸다. 이어서 왜구들은 이대원이 고함칠 때마다 손발을 하나씩 잘랐다. 하지만 이대원은 왜구들의 칼에 목이 떨어질 때까지 왜구를 꾸짖었다.
나중에 선조는 이대원에게 병조참판을 추증했으며 사당을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1587년에 고흥 도양읍에 이대원 사당이 세워졌다. (1592년에 녹도만호 정운이 부산포 해전에서 전사하자, 이순신의 요청으로 정운이 합향되었고, 1683년에 쌍충사로 사액되었다.)
이대원은 충절의 수군 장수였다. 이대원의 고향인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산83-6에는 이대원의 묘와 1699년에 세워진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명은 소론의 영수 남구만(1629~1711)이 지었는데 비문에는“임진왜란에 호남이 유독 완전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었으니, 이는 공이 먼저 왜적에게 몸을 맡겨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려하고 분발시킨 효험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고 적혀있다.
한편 2월 26일에 조정은 전라감사가 ‘왜적선(倭賊船) 18척이 흥양을 침범하여 녹도만호 이대원이 전사했다’고 치계한 것을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이러자 선조는 우윤 신립을 방어사(防禦使)로 삼아 군관 30명을 거느리고 그날로 나가게 하였다. (선조실록 1587년 2월 26일)
또한 변협을 좌방어사(左防禦使)로 삼아 밤을 새워 남쪽으로 보냈고, 우참찬 김명원을 전라도 순찰사로 삼아 손죽도를 침범한 적을 치게 했다. 전라감사 한준도 도내의 고을에 전령하여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게 하였다.
그런데 출정한 지 5-6일이 지나도 흥양 해변에 왜구의 기척이 없자 조선군은 진을 파하였다. 이는 왜구가 다른 곳으로 간 뒤여서 그야말로 뒷북치기였다.
한편 왜구들은 흥양 손죽도에 이어 선산도를 약탈한 후 납치한 백성들을 배에 태우고 강진 가리포(현재 완도군 소재)까지 넘어갔다. 이는 마치 남해안 각진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수군의 전력(戰力)을 정탐하는 듯 했다.
왜구의 공격으로 가리포군은 주둔지를 점령당하고 병선 4척을 빼앗겼으며, 첨사 이운은 왼쪽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하고 말았다. 전라우수사 원호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가리포진이 함락되고 말았다.
한편 이대원이 전사한 지 두 달 뒤에, 비변사는 군율에 따라 전라좌수사 심암(沈巖)을 잡아다가 신문한 다음 서울 당고개에서 효시(梟示 목을 베어 매달아 일반에게 보이는 것)하였고, 전라우수사 원호(元壕)도 국문을 받았다.
6월 4일에 사헌부가 전라감사 한준이 왜적의 형세를 보고 도망갔다며 파직을 청했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전라감사 한준은 이대원이 패하여 죽었을 당시 순천에 도착하여 적의 형세가 왕성하다는 말을 듣고 내지(內地)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때 노약자들이 길을 막고 붙들면서 호소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벌벌 떨며 물러가 웅크렸기에 남쪽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파직시키소서.’이러자 선조는 한준을 파직시켰다.”(선조실록 1587년 6월 4일)
1587년 3월 2일에 선조는 왜변에 대응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전교했다. (선조실록 1587년 3월 2일 1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적과 맞서 응변할 적에는 마땅히 적의 용병(用兵)하는 형세를 잘 알아 대응해야 된다. 적은 이미 손죽도(損竹島)에서 승리하고 또 선산도(仙山島)에서 약탈하였으니, 그 날카로운 기세를 타고 바로 변경의 성을 침범하기는 그 형세가 매우 용이하다. 그런데도 바깥 바다에 계속 체류하고 여러 섬에 나누어 정박하면서 오래도록 쳐들어오지 않아 그 실정을 측량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참작하여 아뢸 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병(精兵)을 보내 주고 적을 방어할 모든 기구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병조에 이르라.’
이러자 병조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回啓)하였다.
‘지금의 왜변(倭變)은 우연히 변경을 침범한 것이 아닙니다. 전선(戰船)을 넉넉히 준비하여 대거 침입했습니다. 고풍손(高風孫)이 전한 대로 사을화동(沙乙火同)의 소행이란 것이 이미 빈 말이 아닙니다. 한 번 교전하고서 선박을 불태우고 장수를 죽였으니 곧바로 다른 곳을 침범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을 지체하면서도 진격도 후퇴도 않기 때문에 그 실정을 가늠하지 못할 듯 하지만 어찌 심원(深遠)하여 알기 어려운 계책이야 있겠습니까. 전선을 나누어 정박시켜 의심스럽게 만들어서 우리 측이 한 곳에 병력을 집중토록 한 다음 가만히 다른 변경을 치려는 것이 하나요,
원도(遠島)로 물러나 숨었다가 본처(本處)에서 원병을 계속 보내는 것을 기다려보고 일시에 큰 일을 벌이거나, 멀리 떨어진 변경에 출몰하면서 진(鎭)과 보(堡)의 형세를 살펴 허술한 틈을 타 갑자기 공격하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적과 대응하는 곳은 방어가 그다지 허술하지는 않은데 본도(本道)에서 우려할 만한 곳은 가리포(加里浦 당시 강진현, 지금은 완도군 소재)·진도·제주 등 3읍과 법성창(法聖倉 영광 법성포)·군산창(群山倉)입니다. 그러나 본도의 방책(方策)에 진작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이미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정병은 현재 당상(堂上)·당하(堂下)의 무신(武臣)과 녹명인(錄名人) 및 잡류(雜類)·공·사천(公私賤)으로 활쏘기에 능한 사람을 벌써 선발해서 대오를 나누고 짐을 꾸려 명을 기다리게 하였으며, 궁시(弓矢)와 총통(銃筒)도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철갑(鐵甲)과 철환(鐵丸)이나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자 선조는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이처럼 비변사와 병조는 남해안 방어에 낙관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번 왜구 침범시 향도가 사을화동(沙乙火同)이라는 진도 출신 어부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왜구의 앞잡이는 한 둘이 아니었다. 국내 상황은 백성들이 더 피폐하기만 했고, 부패가 만연하였다.
조선시대의 ‘선조실록’ 편찬자들은 임진왜란 이전의 국내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근래에 사정(私情)이 크게 일어나 공도(公道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행하여지지 못하고 변장(邊將 첨사 ·만호 ·권관 등 변경지역 장수)의 임명까지 인물 본위로 하지 않으며, 나라는 군정(軍政)의 문란으로 재정이 곤경에 처해 있고, 더구나 해마다 거듭되는 흉년으로 도적이 각 지방에서 일어나고 백성들은 조세 ·공물 ·병역 ·무역 등을 견디어 낼 수 없어서 도망하는 이농자가 속출하였고, 또 여기에 족린(族隣)의 징(徵)으로 농민들이 이산되고 있었다. ”(최영희 지음, 임진왜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p 47에서 인용)
또한 1589년 4월에 조헌은 나라가 날로 잘못되어 위란(危亂)한 지경에 있음을 보고 충분(忠憤)을 견디지 못해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그는 탄핵을 받아 함경도 길주로 유배되었다. (선조수정실록 1589년 4월 1일)
한편 임진왜란 때도 사을화동과 비슷한 반역자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함경도 회령부의 아전 국경인(鞠景仁)은 1592년 7월에 함경도에 피난 온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박하여 왜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