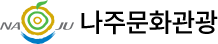(2) 나대용 장군의 탄생
- 작성일
- 2022.07.05 09:31
- 등록자
-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95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 2회 나대용 장군의 탄생
김세곤 지음 (호남역사연구원장,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자와 사단법인 체암나대용장군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나대용 장군의 탄생
전남 나주시에 있는 소충사(昭忠祠)와 나대용(羅大用, 1556~1612) 장군 생가를 방문했다. 소충사는 나대용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1978년에 세워졌다. 소충사 앞 기념공원에는 나대용 장군 동상과 거북선 모형, 그리고 체암 나장군 기적비(紀蹟碑)가 있다. 기적비는 1975년 4월에 세워졌는데 이은상이 비문을 지었다.
‘기적비문’을 읽는다.
“우리는 누구나 임진난(壬辰亂)을 모르는 이가 없고, 임진란이라면 충무공과 거북선을 연상하면서도 정작 거북선 제작에 큰 공로를 세운 나대용 장군을 아는 이는 적으므로 여기서 장군의 사적을 밝혀두려 한다.
장군의 자는 시망(時望),호는 체암(遞菴) 본관은 금성(錦城), 삼한공신(三韓功臣) 총례(聰禮)의 후손으로서 부친은 항(亢) 모친은 광산김씨인데 고향 나주(羅州)는 고려 태조의 해군 격전지였고 또 고려말 정지(鄭地) 장군의 태생지이더니 그로부터 1세기 반이 지나 명종 11년 서기 1556년 7월 29일에 장군이 그 전통의 고장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탄생일(1556년), 장소(나주), 그리고 족보(금성나씨)이다.
첫째 나대용 장군은 1556년(명종 11년) 음력 7월 29일 나주시 문평면 오룡리 472번지에서 태어났다. 1556년(명종 11년)은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일어난 지 1년 후였다. 1555년 5월에 을묘왜변이 일어났다. 왜구가 선박 70여 척으로 해남 달량포(達梁浦)와 어란도(於蘭島)를 침입한 뒤, 장흥·영암·강진 일대를 분탕질 했다. 전라도 해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절도사 원적과 장흥부사 한온 등은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은 포로가 되는 등 백성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이러자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을 도순찰사로 임명하여 영암에서 왜구를 섬멸하였다. 한편 을묘왜변의 여파로 조선의 전함은 종래의 맹선(猛船)에서 판옥선(板屋船)으로 교체되었다.
# 해양의 중심지 나주
둘째, 나대용 장군은 나주(羅州)에서 태어났다. ‘고려지’에 따르면 성종 14년(995년)에 전주(全州)ㆍ영주(瀛州)ㆍ순주(淳州)ㆍ마주(馬州)등의 주현(지금의 전라북도)을 강남도(江南道)라 하고, 나주(羅州)ㆍ광주(光州)ㆍ정주(靜州)ㆍ승주(昇州)ㆍ패주(貝州)ㆍ담주(潭州)ㆍ낭주(郞州)등을 해양도(海陽道 지금의 광주광역시·전라남도)라 하였다.
그런데 1018년에 현종은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 했는데, 전라도의 명칭은 강남도 전주와 해양도 나주의 머리글자를 합한 것이었다. 그만큼 나주는 전라 남부 지역의 중심지였다.
나주는 본래 백제의 발라군(發羅郡)으로 757년 신라 경덕왕 때 금산군(錦山郡)으로 고쳤다. 신라 말에 후백제의 견훤이 나주를 차지했다. 그런데 903년에 궁예의 부하인 송도 해상세력 출신 왕건(王建, 877~943, 고려 태조 재위: 918~943)이 수군을 이끌고 공격하여 차지한 뒤 나주(羅州)로 고쳤다.
이어서 912년경에 왕건이 다시 서남해 공략에 나섰을 때 견훤은 후백제의 해군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견훤은 전함을 목포에서 덕진포에 이르는 영산강하구에 배치함으로써 왕건이 나주의 호족 세력과 연결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난관에 봉착한 왕건은 바람을 이용한 화공책을 써서 견훤의 전함을 거의 전소시키고 후백제군 500여급을 목베는 완승을 거두었다. 견훤은 작은 배에 갈아타고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이 해전이 덕진포(德眞浦)헤전’이다. 이 해전으로 왕건은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런데 신덕왕 3년(914년)에 나주 지방이 다시 불안해지자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에 와서 사태를 수습하였다.
한편 나주 완사천(浣絲泉)은 왕건과 나주 호족 오다련의 딸이 만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건은 샘가에서 빨래 하고 있는 한 처녀를 만났다. 왕건이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처녀는 바가지에 물을 떠 버들잎을 띄워서 공손히 바쳤다.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까봐 천천히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왕건은 처녀의 총명함과 미모에 끌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바로 왕건의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莊和王后) 오씨(吳氏)이다.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29명의 후비를 얻었다. 이들은 주로 지방 호족의 딸이었다.)
장화왕후에게서 태어난 아들 무(武)가 제2대 왕 혜종(惠宗)이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 전라도 나주목(羅州牧)’편에는 혜종에 관한 묘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태조가 그 여자를 불러 동침하는데 미천한 신분이라고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정액(精液)을 자리에 쏟았더니, 왕후가 곧 빨아 먹었다.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혜종(惠宗)이다. 얼굴에 자리 무늬가 있으므로 세상에서는 접주(襵主 주름살 임금)라 한다.”
나주는 고려 성종 18년(999년)에 진해군(鎭海郡)이라 하였는데, 현종 9년(1018)에 전라도 나주목(牧)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에 나주는 전주와 함께 전라도의 요충지였는데, 나주시는 1981년 7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금성시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86년 1월 1일에 다시 나주시로 개칭했다.
# 고려 삼한공신 나총례와 대장군 나유
셋째, 나대용 장군의 본관은 금성나씨(錦城羅氏)이다. 시조는 삼한공신(三韓功臣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린 이름)으로 대광(大匡)을 지낸 총례(聰禮)이다. 그는 나주의 호족으로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공을 세웠다. 궁예의 부하인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후백제의 땅인 나주를 점령했다. 나주 호족들이 적극적으로 왕건을 도와준 덕분이었다. 그것은 송악 호족인 왕건 집안이나 나주 호족들 모두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해상 세력이어서 예로부터 서로 연결 끈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주 호족 나총례는 삼한벽상일등공신(三韓壁上一等功臣)의 봉호를 받고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참고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란 936년(태조 19)에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태조 23)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동서 벽에다가 삼한공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여기에 그려진 인물은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유금필, 김선궁, 이총언, 김선평, 권행, 장정필, 윤신달, 최준옹, 문다성, 이능희, 이도(李棹), 허선문, 구존유, 원극유, 금용식, 김훤술, 한란, 강여청, 손긍훈, 방계홍, 나총례(羅聰禮), 이희목, 염형명, 최필달, 김홍술, 김락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한국고전종합 DB, 사미헌집 제10권- 묘갈명)
한편 나총례의 7대손 효전(孝全)은 고려의 예부상서를 지냈고, 충렬왕(忠烈王) 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지낸 나유(羅裕 1224~1292)와 나유의 아들 나익희(羅益禧 1271~1344)가 고려때 현달하였다.
나유는 고려 원종(元宗)~충렬왕 때의 무신으로 김방경(金方慶)이 제주(濟州)의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할 때 선봉장으로 참전하여 대장군에 올랐고, 합단(哈丹)이 동북변경을 침범하였을 때 공을 세웠다.
그러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나유(羅裕)를 살펴보자.
나유는 진도에서 원수 김방경을 따라 삼별초를 토벌하는 공을 세운 무신이다. 그는 삼한공신대광(三韓功臣大匡) 나총례의 10세손이며, 아버지는 형부상서(刑部尙書) 나득황(羅得璜)이다.
음보(蔭補)로 경선점녹사(慶仙店錄事)가 되었고, 1269년(원종 10) 4월에 세자 심(諶)을 시종하여 원나라에 입조하였다. (...) 1271년 원수(元帥) 김방경을 따라 진도(珍島)에서 삼별초를 토벌하는 공을 세웠다. 1272년에도 전라도의 삼별초를 치는데 군사 1,550명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1273년 김방경을 따라 제주의 삼별초 토벌에 선봉장으로 참전해 대장군(大將軍)에 올랐다. 이때의 공로로 남녀 노비 2명이 하사되고 원나라로부터 중통보초(中統寶鈔)를 받았다.
1274년 정월 일본정벌에 필요한 300척의 전함을 건조할 때, 담당 부부사(部夫使)가 되어 공장(工匠)과 인부 3,500여 명을 징집하는데 힘썼으며 그 경과를 보고하는 사신이 되어 원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10월 제1차 일본정벌 때 도독사(都督使) 김방경과 함께 원나라의 도원수 홀돈(忽敦)의 휘하에서 지병마사(知兵馬使)로 종군하였다. 돌아와서는 응양군대호군(鷹揚軍大護軍)이 되었으며, 그 군공(軍功)으로 원나라로부터 금패(金牌)와 무덕장군관고려군천호(武德將軍管高麗軍千戶)를 받았다. 그 뒤 제2차 일본정벌을 위해 합포(合浦)에 3번이나 출진하였다. 이때 예법에 밝다 하여 개경으로 소환되어 팔관회(八關會)의 의식을 맡기도 하였다.
(...) 1287년 6월 왕에게 원나라의 반란세력을 직접 정벌하도록 청해 호두패(虎頭牌)를 받고 중익부만호(中翼副萬戶)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5월 만호동지밀직사사(萬戶同知密直司事)로 왕의 선두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에 참여하였다. 일이 끝난 후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녹권(錄券), 전(田) 100결, 노비 20구(口), 명위장군(明威將軍)의 호를 받았으며 원나라로부터 쌍주금패(雙珠金牌)를 받았다.
1289년 3월 충청도도순문사(忠淸道都巡問使)가 되어 군량을 독려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동계방수군(東界防戍軍)을 징발하였다. 1290년 5월에 합단(哈丹)이 국경을 침입할 때 통천(通川)의 경계에 주둔하여 그를 막았으며, 평양과 연기(燕岐)에서 합단을 크게 무너뜨렸다. 이듬해 6월 교주도(交州道)에 파견되어 합단의 잔병을 토벌하였다. 1291년 11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원나라에 정조사(正朝使)로 다녀왔다. 이때 원나라로부터 삼주호부(三珠虎符)·옥대(玉帶)·은정(銀錠)·궁시(弓矢)·검(劍)·안마(鞍馬) 등을 받고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의 호를 받아 이듬해 돌아왔다. 예의에 밝고 옥사(獄事)의 판결에도 능하였다. 또한 용맹이 있어 전쟁에 임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변방에서 자주 공을 세웠다.
또한 나유는 1456년(세조 2년) 3월 28일의 ‘세조실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날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가 세조에게 상소한 내용 중에‘전대(前代)의 임금과 재상(宰相)을 제사하는 것’이 들어있다.
“본조는 역대의 군왕이 도읍하였던 곳에서 산제(散祭)하는 데도 혹은 당연히 제사 지내야 할텐데 제사하지 않는 것이 있고 혹은 배향(配享)한 대신(大臣)이 없어 흠전(欠典)된 것 같으니, 바라건대 매년 봄·가을로 동교(東郊)에서 전 조선왕(朝鮮王) 단군, 후 조선왕 기자, 신라의 시조(始祖)·태종왕(太宗王)·문무왕, 고구려의 시조·영양왕, 백제의 시조, 고려의 태조·성종·현종·충렬왕 이상 12위(位)를 합제(合祭)하고, 신라의 김유신·김인문·고구려의 을지문덕, 백제의 흑치상지와 근일에 정한 전조(前朝)의 배향 16신(配享十六臣)과 한희유·나유(羅裕)【합단(哈丹)을 막는 데 공이 있었음.】·최영·정지(鄭地)【왜구를 막는 데 공이 있었음.】등을 배향(配享)하게 하소서.”(세조실록 1456년 3월 28일)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편’에도 나유와 나익희가 수록되어 있다.
“나유(羅裕) : 사람됨이 용감하고 출중하여 예의에 밝고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데 밝았다. 난을 당하여 두려워하지 않아 자주 변방에서 공을 세웠다.”
나익희(羅益禧) : 나유의 아들이다. 벼슬은 상의평리(商議評理)에 이르렀다. 성품이 곧고 절의를 사모하여 사람과 다투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의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분배하면서 특별히 종을 더 주니, 그는 사양하면서, “한 아들로서 다섯 자매의 사이에 있으니, 어찌 차마 구차스레 재물을 차지하여, 시구(鳲鳩)의 인(仁)을 손상하게 하겠습니까.”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의롭게 여겨 그대로 좇았다. 시호는 양절(良節)이다.
이처럼 나대용(羅大用)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바다와 관련한 일을 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의 이름 대용(大用)처럼 ‘나라에 크게 쓰일’ 인물이었다.